앞선 글에서 요트구입/유지관리에 생각 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요트 구입 전 무엇을 해야하는지 글을 이어가야 하는데...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쓰고 일본에서 중고요트를 사서 끌고오는 과정을 적은 항해기를 먼저 올리고자 한다. ^^
이 항해기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크루저요트협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나는, 등산은 본질적으로 파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매혹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혹적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Jon Krakauer
[Into thin air : a personal account of the mount Everest disaster]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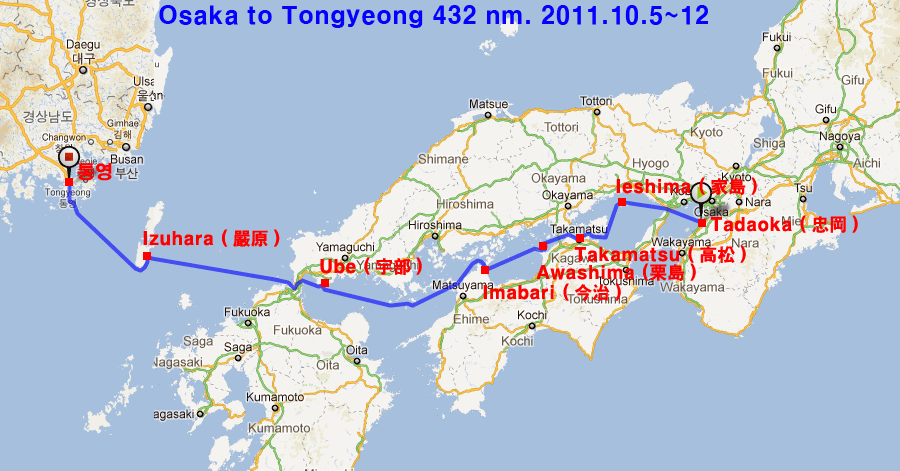
GPS와 전자해도의 도움으로 ‘항해’는 더 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정인들만의 영역이 아닌 일반인들의 영역으로 이동(추락?)한지 오래다.
어군탐지기를 이용하면 수심은 물론 그 지형까지 손바닥 보듯 확인할 수 있고 GRIB 데이터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상자료는 일주일 정도의 날씨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바다가, 항해가 만만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대할 때 마다 느끼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매혹은, 사이렌의 노래 소리 처럼 아름답지만 그안에 파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다는, 몇몇 숫자와 통계로 파악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낯선 바다를, 그것도 외국의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분명, 매혹적인 일이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그만 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요트(미국 PEARSON사 제작, FREEDOM 30피트 1986년 모델) 딜리버리를 위해 오사카로 향하는 짐을 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인생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다만, ‘사람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행’이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J와의 항해가 어떨지 일말의 우려를 떨쳐내기는 힘들었고 여행을 마친 지금 되돌아 보니 그것이 전혀 근거없는 기우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항해를 위한 요트의 상태(선체, 엔진, 세일, 리깅 등)는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황.
세관, 해상보안청, 국토교통성 운수국 등의 서류처리를 위해 이틀을 소비했다.
한국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국적의 요트를 사면 제일 처음 해야 할 절차는 전 주인이 등록말소를 하는 것이다.
그 후 한국사람인 새 주인은 한국 영사관에 가서 요트의 국적을 한국으로 만드는 ‘가국적등록’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 요트는 일본에 있는 외국국적의 선박이 되므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마리나 입출항 시 일본 요트는 하지 않는 입출항 신고를 해상보안청에 해야 하고
한국으로의 딜리버리 도중 불개항장(closed port)에는 기본적으로 입항할 수 없다.
(불개항장 입항을 위해서는 각 지역 운수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는 실제로 그 절차를 밟았다 – 불개항장기항특허신청 필요)
이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출항 전 세관원이 직접 요트를 확인한다
- 타소장치허가신청, 지정지외화물검사허가신청 필요.
해상보안청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그 이유는 최종 출항지(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도장을 받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항구)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최초 출항지(요트를 구입한 항구)의 입출항계入出港屆(General declaration)가 있는데 이 서류가 세관과 해상보안청의 공통양식이라
이전까지의 한국 딜리버리 스키퍼들은 세관신고를 통해 이 서류를 받고 해상보안청 신고는 하지 않은 체 딜리버리를 완료하곤 했는데
웬일인지 우리는 시범케이스(?)로 걸려 해상보안청 신고(항해관련 제반사항 신고 – 항해계획서 작성, 항로관련 지식 확인, 항해장비/물자 신고 등)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일본 에이전트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그 동안 한국 딜리버리 스키퍼 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내서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는 모르겠다) 용감무쌍하신 선배님들 덕분에 해상보안청에 두 번이나 들러 구구절절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출항 전날에는 직접 요트에 온 3명의 해상보안청 인원에게 배의 상태며 항해장비 등을 확인시켜줘야 했다.
지금도 오사카 해상보안청의 어느 파일 안에는 요트 앞에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한국인 두 사람의 사진이 꽂혀 있을 것이다.
“30피트 요트를 끌고 처음 일본내해를 지나 한국으로 항해하려는 무모한 한국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달고…
점점 Paper Work가 없는 회사로 이직한 것을 그나마 위안이 되는 직장운으로 생각했던 나였기에 위와 같은 서류처리 절차가 달갑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배를 사오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다. 일본어가(영어라도)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실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이런 서류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인)에도 있고 일본(인)에도 있다. 물론 일본 현지의 가격이 조금 싸다. (3만~10만엔, 한국에서는 10만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서류처리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흥정을 통해 적당히 깍아 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그만큼 깍을 수 있다. 중고품은…
항해는 예상보다 수월했다. 배의 상태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날씨가 평온했다.
2011년 10월 5일부터 12일 까지,
8일 만에 Osaka 大阪 – Ieshima 家島 – Takamatsu 高松 –Awashima 栗島 – Imabari 今治 - Ube 宇部 – Izuhara 嚴原 를 거쳐 통영에 도착했다.
총 항해 거리는 432 마일.
Imabari -> Ube 구간 및 Ube -> Izuhara, Izuhara -> 통영 구간에서 3회에 걸쳐 야간항해로 일정을 줄일 수 있었다.
항해 시작시의 원칙은, 낯선 지역의 첫 항해이므로 주간항해로 일일 40마일 정도 나아가는 것이었으나 항로주변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항로표지등의 항해보조시설 양호, 무분별한 그물 없음 등)
일정이 늘어지는 것을 염려해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야간항해를 감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고백하자면, 야간당직을 서며 살짝살짝 졸기도 했다. 서해안의 그물 지뢰밭이었다면 결코 졸음 같은 것은 얼씬도 하지 않았겠지만 가끔씩 코스만 확인하면 그만인 일본내해에서 새벽당직(새벽2시~6시)에 찾아오는 졸음의 달콤한 유혹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단, 대마도 Izuhara -> 통영 구간의 대한해협에서는 야간당직 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웬일인지 일본내해에서는 느린 우리 요트를 안전하게 추월해 갔던 대형 선박들이 대한해협 구간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두 세 차례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평소에 얌전하게 운전을 하던 사람도 운전습관이 난폭한 동네에 가면 어느새 난폭한 드라이버가 되듯 배들도 마찬가지인 것인가 생각하게 되니 웬지 씁쓸했다.
평소 입파도 근처 세일링에서 보게 되는 개념 없는 어선과 상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교본에 나오는 항행우선순위는 무시되고 느리고 작은 배가 언제나 피해야 하는 한국의 바다… 도로교통 질서가 점차로 개선되었듯 바다에서의 항행질서도 개선되는 날이 올까 의심스럽다.
다음편에서 하루하루의 항해기를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