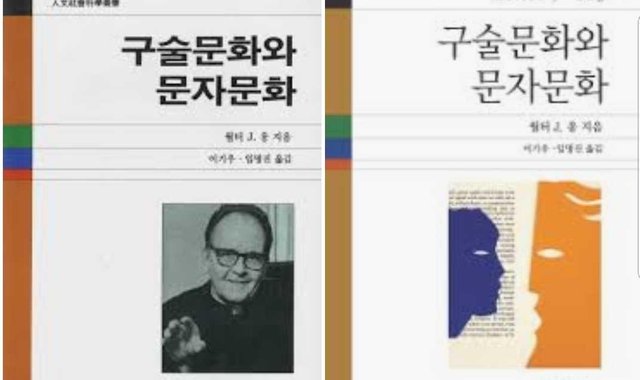우선 맛보기 글입니다.
①<(글)쓰기는 의식(생각)을 재구조화한다>
②<책읽기. 책의 골자(骨子)를 추출하면 책은 피를 흘릴 것인가?>
③<대소문자 구분에 의한 철자법은 거의 18C에야 자리잡는다-유럽>
④<마침, 쉼, 물음, 느낌표 없는 글 13C에야 사라진다. 유럽>
⑤<모음과 자음 구분기준은 자유, 입속의 자유. 걸리적거림 없는>
⑥<고대 그리스는 페니키아 알파벳 쓰기법은 왜 따르지 않았을까?>
⑦<초기 고대 그리스 문장, 짝수 줄의 알파벳은 물구나무를 섰다>
⑧<12C까지 유럽은 묵독(默讀)하면 이상하게 쳐다봤다. 우리는?>
⑨<알파벳문자만이 문명문자라고 한 자 둘. 루소와 맥루한. 이런..>
⑩<한글은 문자. 찌아찌아어는 언어. 같이 가보려 했는데>
⑪<글로는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말로는 뜻을 다 전하지 못한다>
⑫<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은 왜? 면죄부 대량 판매로 돈벌려고>
⑬<중국에서 유럽 전래. 종이, 화약, 나침반. 금속활자는 빼야>
⑭<한자, 표의문자는 옛 인쇄술 발전에는 불리. 독특한 에크리튀르>
⑮<먹, 벼루, 붓과는 달리 종이는 기원 후에 발명되었다. 음...>
⑯<양피지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수출 금지땜에 탄생했다>
⑰<진시황은 분서갱유 당시 종이책을 불태우지 않았다>
1.∼8.
- 글쓰기와 글읽기가) 흥미있는 서두 열기
나) 먼저 글쓰기
a) ∼ g)
h) (직전 글)
다) 이어서 글읽기
a) 글읽기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
글읽기는 글쓰기와의 관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이해될 수 있다.
아래의 개념들은 서로 얽혀 있고 나아가 철학적 사유로 이끈다
그건
-언어에 천착한 학자들과
-문자에 천착한 학자들이다.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철학적 사유인데, 나는 다루지 아니한다. 아직은 좀 더 공부해야 한다.
① 구술성과 문자성
글읽기와 글쓰기를 따지기에 앞서 몇가지 관련 개념을 따진다.
이전 글에서 언어와 문자에 대한 구별을 강하게 했었다.
두 가지 모두 의사소통의 방법임을 말할 나위없다.
두 가지를 둘러싼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구술성과 문자성(口述性/文字性, Orality/Literacy)>
-언어(말)의 형태로 소통될 때 지니는 성질을 구술성
-문자(글)의 형태로 소통될 때 지니는 성질을 문자성
참고로 이미 앞에서 ‘언어’가 말 또는 ‘언어’가 문자의 형태로라는 식의 표현은 안하기로 했다. 그냥 ‘언어=말,’ ‘문자=글’이라는 것으로.
관련한 문화현상이 있다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건 월터 옹의 책(후술함)의 번역어이기도 하다.
흔히 구술성에서 문자성으로의 이동을 문명사회로의 진입이라 한다.
그래서 문자성은 문명성과 같이 가는 것으로 보는 생각이 자리잡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다만, 문명사회에서는 문자성이 주축이 된다는 의미이지 구술성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하나 기억하여야 할 것은 구술성과 문자성이 우월을 논하는 기준도 아니라는 것이다.
차이의 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는 이슈일 뿐이라 것이다.
이를 더 깊이 정리하여 논한다면
문명은 차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에 구술성보다 문자성을 우위에 둔다.
문화는 차이의 개념만을 내포하고 있기에 둘 다 같은 값을 갖고 있다.
이는 문명과 문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구술성과 문자성의 개념이 월터 옹(Walter. J. Ong, 1912∼2003년)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1982)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좀 헛갈리게 된다.
아니 헛갈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글쓴이들이 헛갈리게 했
다.
번역된 책도 그렇고, 해석하고 살붙이는 사람들도 그렇다.
⒜ 먼저, 왜 책의 제목에 문화라는 췌언을 붙였는데 올바른 것인가?
결과적으로 구술성이나 구술문화는 같은 뜻으로 봐야한다.
⒝ 둘째, 구술성을 1차와 2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
이게 헛갈리는 이유를 만든다.
-1차적 구술성(Primary orality)이란 문자 혹은 인쇄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의 사상과 언어 표현을 가르키는 것이다.
문자 이전시대의 구술성.
-제2차 구술성(Secondary orality)을 완전한 비문자 단계의 제1차 구술
성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더 정교하고, 자의식적인 구술성으로, 주로
문자와 인쇄술 사용에 기반하고 있는 구술성이라고 정의
그러나 위의 분석은 틀렸다. 번역된 책도 일부 그렇다.
틀린 글이 인터넷이 넘쳐난다. 네이버마저도.
월터 옹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뭐라 했는가?
그에게는 구술성이
-1차적, 2차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고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었다.
-아니 설명은 되었어도 단계적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의 구술성은 오로지 구술성이다.
Secondary 구술성은 2차적이 아니라 부차적(副次的) 구술성이다.
이에 비하여 원래의 구술성을 Primary라고 한 것 뿐이다.
이게 ‘1차적’ 구술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부차적 구술성은 아래의 글처럼 인쇄시대를 넘어 전기 시대의 미디어 현상을 보고 특히 TV, 라디오 시대의 부상을 보고 가져다 붙인 설명에 불과한 표현이다.
그래서 부차적(Secondary)이라고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인식은 바로 그의 스승 맥루한의 관점과 다르지 않다.
맥루한은 책을 폄하하고 TV를 칭송하였기에...
그리고 무문자사회, 무문자성 또는 무문자문화라는 개념도 많은 인문학 책에 등장한다.
무문자사회에 관한 전문가로는 ‘가와다 준조’의 <무문자사회의역사>(2004)을 통해 알 수 있다.
개념으로는 무문자사회가 구술사회보다 넓은 개념인 것은 당연하다.
② 관련한 단계나 시대 구분
⒜ 월터 J. 옹(Walter. J. Ong)은 문화의 단계를 전달매체에 따라
[구술·청각적 단계 → 문자·인쇄의 단계 → 전기의 단계]
월터 옹은 이러한 식의 표현은 또 다른 책에서 깊이 있게 논했다.
문자의 단계는 인쇄 시대와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문자의 단계는 기록 문학 시대이다.
그럼 문자단계 이전은 구비문학(oral literature, 口碑文學) 시대라고 할 수 있나?
참고로 월터 옹은 구비문학 자체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학은 글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구비와 글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말(馬)을 바퀴없는 자동차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텍스트도 좁게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글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기에.
⒝ 미디어의 시대...온갖 미디어의 시대...맥루한은 아래처럼 구분한다.
[구어 시대->필사 시대->인쇄 시대->전기시대]
필사의 시대는 말의 필사이다.
책의 필사라기보다는....그렇지만 역시 문자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이미 3000년 전부터 문자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단계적 구분과 역사적 구분은 참 헛갈리게 한다.
그래도 맥루한의 시대 구분이 더 이해하기 쉽다.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to be continued
목차
- 정보의 저장고
가) DNA
나) 대뇌피질
다) 문자, 책, 도서관 - 뭘 더 알아볼 것인가? (이번 글)
- 정보의 저장 방법 - 소리 전달 이후의 글쓰기
가) 어디에다 글을 썼을까?
나) 책(冊, book)이란 낱말은 어디서?
다) 책의 형태는? - 정보의 대량 생산
가) 인쇄 기술의 발전과 배경
나) 종이와 인쇄술 - 인쇄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려면 - 대량생산과 보급
- 무엇을 쓰고, 인쇄하나 - 언어와 문자의 구분
- 정리된 ‘언어’와 ‘문자’의 구분 기준과 ‘언어’의 외연
- 문자성과 문자의 우월성이란 실체인가 허상인가?
- 글쓰기와 글읽기가) 흥미있는 서두 열기
나) 먼저 글쓰기 (직전 글)
a) 서론 (직전 글)
b) 고대 그리스 글쓰기 시작 - 문자의 도입
c) 고대 그리스 알파벳의 글쓰기 - ‘물구나무 쓰기’부터
d) 고대 그리스 알파벳의 글쓰기 - 소몰이 쓰기법
e) 로마자(라틴 문자)의 시작
f) 로마자(라틴 문자)의 변화 - 소문자 등의 등장
g) 로마자(라틴 문자)의 변화 - 오늘날의 글쓰기 시작
h) 한자문화권의 우종서와 좌횡서 (직전 글)
다) 이어서 글읽기
a) 글읽기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 (이번 글)
b) 글읽기와 관련된 몇 가지 관점
c) 성독과 묵독에 관한 맛보기 글
d) 글읽기의 대상 – 문자의 종류
e) 글읽기 – 성독
f) 한자문화권의 글읽기
g) 여담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