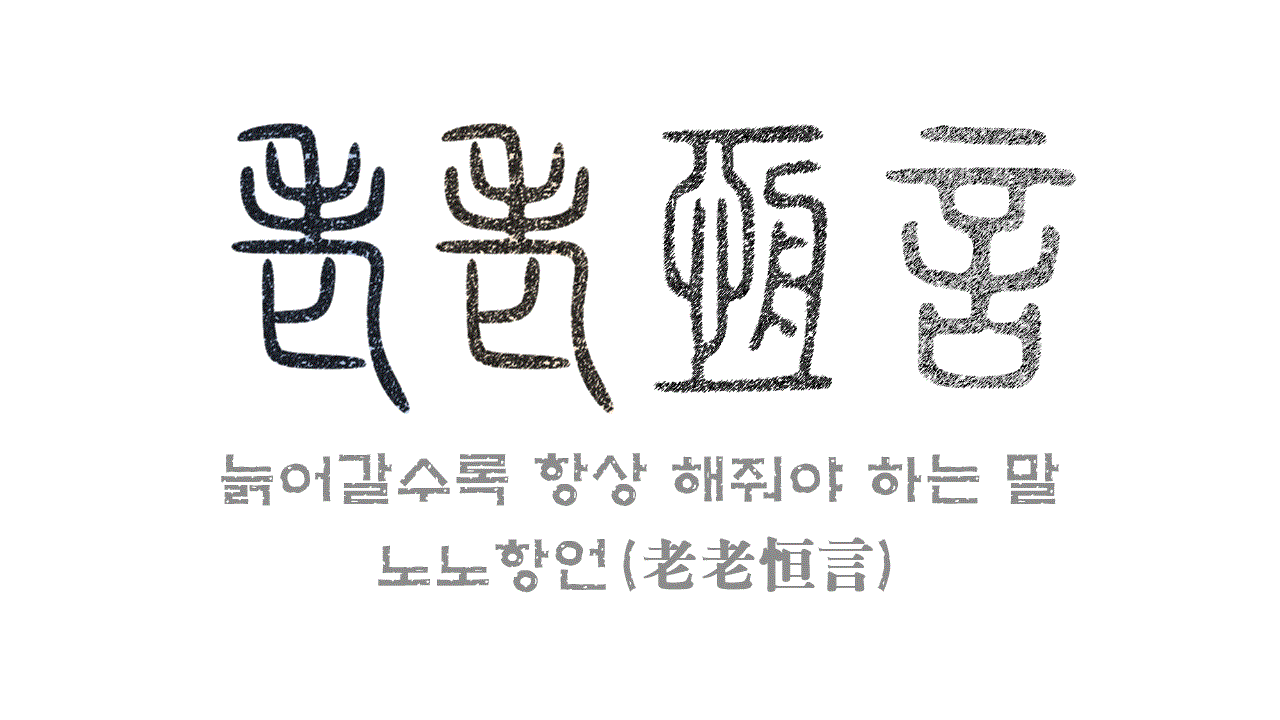
예기(禮記)의 왕제(王制)편에서 아흔이 되면 먹을 때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침(寢)은 잠자는 곳으로 일어나서 생활하는 방이란 뜻이다. 아흔이 되기 전에 정력이 쇠약해지면 침실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보고 듣는 것을 적게 하고 말과 웃음을 아끼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정신을 기르기에 충분한데 병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다. 광성자(廣成子)는 보지도 듣지도 말고 정신을 고요히 감싸면 형체가 스스로 바르게 된다고 했다. 마음은 정신의 집이고 눈은 정신의 창이다. 눈이 이르는 곳에 마음 역시 이른다. 음부경(陰符經)에서 기미가 눈에 있다고 하였다. 도덕경(道德經)에서는 욕구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고 했는데 평소 일이 없을 때 방에 묵묵히 앉아 항상 눈으로 코를 보고 코로 배를 보며 호흡을 고르게 하여 계속하되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불(열정)을 기해(氣海, 배꼽 밑 경혈)로 내리면 몸 전체가 넓게 펼쳐짐을 알아차리게 된다. 정관경(定觀經)에서는 일을 처리함에 실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벌려 시끄럽게 하지 말아서 싫어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억지로 번거로운데 나아가니 대개 실증도 싫어함도 없어야 일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일이 많아 번거롭다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충허경(沖虛經)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 힘쓰는 것은 명상에 힘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記·王制》雲:“九十飲食不離寢”,寢謂寢處之所,乃起居室之意。如年未九十,精力衰頹者,起居臥室,似亦無不可。少視聽、寡言笑,俱足寧心養神,即祛病良方也。 《廣成子》曰:「無視無聽,抱神以靜,形將自正。」心者神之舍,目者神之牖;目之所至,心亦至焉。 《陰符經》曰:“機在目”,《道德經》曰:“不見可欲,使心不亂。”平居無事時,一室默坐,常以目視鼻,以鼻對臍,調整呼吸;無間斷,毋矜持,降心火入於氣海,自覺遍體暢通。 《定觀經》曰:“勿以涉事無厭”,故求多事,勿以處喧無惡。強來就喧,蓋無厭無惡,事不累心也;若多事就喧,心即為事累矣! 《沖虛經》曰:“務外遊,不如務內觀。”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노년기에는 마음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번거로움을 줄이고 성찰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깥 일보다는 내적 성찰 혹은 명상에 힘쓰는 것이 낫다. 다만 지금 이 시대가 환갑이 되어도 청춘이긴 하다. 은퇴 시기가 되면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지 걱정되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쉬어야 할 시기인데 경제적 안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불안해진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다. 욕구는 한계가 없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노년기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다면 욕망을 줄일 필요가 있다. 더 많이 갖는 것 보다 어느 정도가 내가 사는 데 충분한지 살펴볼 일이다. 그러려면 고요한 마음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노노항언(老老恒言)
노노항언(老老恒言)을 시작하며 | 자산의 머릿말(慈山序) | 개꿀잠(安寢) 1, 2, 3, 4, 5, 6, 7, 8, 9, 10, 11 | 아침 적응(晨興) 1, 2, 3, 4, 5, 6, 7, 8, 9 | 세수(盥洗) 1, 2, 3, 4, 5, 6, 7 | 음식(飮食) 1, 2, 3, 4, 5, 6, 7, 8, 9 | 먹거리(食物) 1, 2, 3, 4, 5, 6, 7, 8 | 걷기(散步) 1, 2, 3, 4, 5 | 낮잠(晝臥) 1, 2, 3, 4, 5, 6 | 야좌(夜座) 1, 2, 3, 4, 5, 6, 7 | 편히 지냄(燕居) 1, 2,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